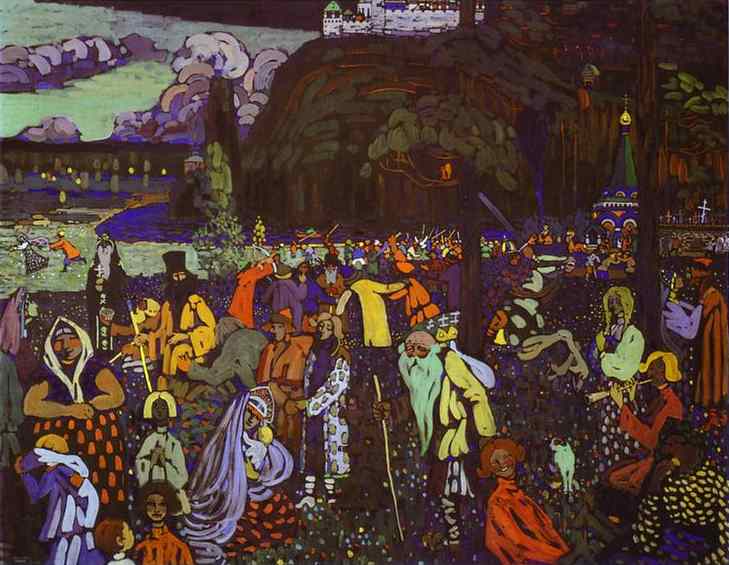-독서 리뷰-
<차남> <월남댁>
<차남>
-선우숙임 作-
***동우***
2018.06.07 23:04
'선우숙임(1964~ )"의 '차남(次男)'
나로서는 처음 읽는 작가입니다.
알고보니 '선우숙임'은 한때 언론인과 작가로 선이 굵은 글로 필명을 날렸던 '선우휘(1922~1986)'의 따님이로군요. (선우휘의 소설은 리딩북에 몇 번 올린바 있지요.)
개만도 못한 인간, 숙부.
온갖 권모술수와 사기로 형과 조카들, 여러 친척들에게 크고작은 피해를 주며 살아온 작은아버지(叔父).
심지어 조카 며느리에게까지 찝적대다가 파혼을 시켜버리고.
숙부는 진작에 사람 취급받기는 글러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 상청(喪廳)에서 ‘나’는 듣게 됩니다.
할아버지 명에 의해 형(나의 아버지) 대신에 차남인 그가 카미카제로 끌려갔다 살아왔다는 사실.
그 옛날 봉건사회의 장남에 대한 집착은 대단하였지요.
차남으로 태어나, 장손인 형님 대신에 사지(死地)로 끌려갔던 트라우마가 저토록 삐뚜른 인간성을 만들었을까요.
나 또한 차남으로 태어난 몸입니다만. ㅎ
내 한 친구의 작은 형님(차남, 농사꾼) 한분은 군대를 다녀온 분인데 큰형님(장남, 화가 교수) 대신에 또 한번 군대복무를 하고 나왔답니다.
어수선하였던 시절 그런 편법도 가능하였던가 보지요?
두 분 다 나도 뵈었는데(그의 큰 형님 전시회에서) 풍만하게 번지르한 큰형님과 새까맣게 꾀죄죄한 작은 형님... 도무지 외양으로는 형제같지 않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장남존숭(尊崇), 촌(산청)의 가부장적 그런 봉건풍습은 그토록 견고하였던가 봅니다.
큰 형님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내 친구는 그림을 공부하고 미술선생이 되었지요.
가독(家督)을 상속(相續)하는 장남.
그 책임감과 부담에 따른 압박감도 만만치 않을것이구만..
그래서 대체로 장남은 대체로 신중하고 믿음직스러운 데가 있는게지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지엄한 왕실의 자식인데도 차남으로서는 감당할수 없었던 들끓는 무엇이 안에 있었을까요.
무참하게 동생들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월남댁>
-정정혁 作-
***동우***
2019.02.08 04:32
정정혁의 '월남댁'
무식한 사납쟁이이지만 월남댁이 世上事를 살아내는 방법론은 올곧습니다.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향한 어프로치는 모름지기 저처럼 저돌적이고 이악스러워야 하지요.
<“이 개잡놈들. 내가 몸맹한 사나그하고 산다고 느그덜이 무시를 해야. 걸리기만 해봐라, 암 늠이든 걸리기만 해 봐.”
월남댁은 무단한 들판에 욕을 퍼부으며 걸었다. 논틀밭틀을 걷다가도 바락바락 악다구니를 퍼부으며 농로를 치달았다. 농로를 지나 신작로와 콘크리트 다리를 건너 마을로 들어서자 곧장 이장 집으로 향했다. 대문을 벌컥 열어 젖히며 마당으로 들어선 모양이 성난 살모사 같다.
“이장인지 개장인지 잔 나와 보씨요.”
카랑카랑한 목청이 우아한 한옥 지붕을 따르르 울린다.
“이장 있소 읎소?”
월남댁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대자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이장댁이 나온다.
“으짠 일이요, 월남댁이? 우리 집 양반은 들에 나가고 읎는디.”
“으디 들로 나갔소. 이장하고 담판 질 일이 있응께 언능 말 하씨요, 언능.”
“음매. 먼 일인지는 몰라도, 성질 잔 죽이고 말 하씨요. 원, 사람 잡어묵을 상을 해싼께, 무서워서 으디 옆에나 가겄소?”
“누가 네 년보고 오락했냐. 네 서방 으딨냐고 물었제.”
월남댁은 목구멍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다.
“아니 월남댁. 시방 믄 말을 그렇게 해부요. 아무리 배운 것 없는 아녀자라지만 해도 너무 하요. 잘못한 것이 있다 쳐도 우리 집 양반이고, 욕을 먹는다 쳐도 우리 집 양반이제, 뭇 땀시 나한테 성깔이요?”
“그래, 이 년아. 네 년 말 한 번 잘했다. 나는 배운 것 읎고 가진 것 읎는 무식한 년이라 쌍말밖에 모른다. 그래, 중핵교까장 댕겠다는 네 년은 을마나 유식허냐? 그릏게 유식한 년이라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가뭄에, 방구들 지고 앉아서 손톱 밑이나 소제하고 자빠졌냐? 그것이 유식한 짓거리냐?”
“훠매 시끄런 거. 귀창 떨어지겄네. 엥간히 잔 떠들고 가씨요. 우리 집 양반은 중학교 너머 염전에 있응께.”
이장댁은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꽝 닫았다.
“간살꾼 같은 놈. 놈은 모내기를 못해 환장인디, 양수기를 염전 밭으로 빼돌려?”
월남댁은 그제야 손에 든 고무신을 꿰신고 성난 부사리 마냥 씩씩거리며 염전으로 치달았다.>
저런 리얼리즘 앞에 서면 나는 부끄럽습니다.
주눅이 듭니다.
내 자의식이 그러합니다.
기개(氣槪)는커녕 제 밥그릇의 부당함 앞에서도 쭈뼛거리는...
쁘띠 부르주아지로 일관한 내 삶의 궤적..
못나빠진.
다 늙어 새삼 부끄럽고 한편 억울합니다.
'내 것 > 잡설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들의 작문교실>>> (1,4,3,3,1) (0) | 2020.12.25 |
|---|---|
| 크리스마스 캐럴 (1,4,3,3) (0) | 2020.12.24 |
| 입는 옷, 숨는 옷 (1,4,3,3) (0) | 2020.12.22 |
| [[이경자]] 1.2 (1,4,3,3,1) (0) | 2020.12.21 |
| [[공룡의 최후. 골렘. 관료주의]] (1,4,3,3,1) (0) | 2020.12.19 |